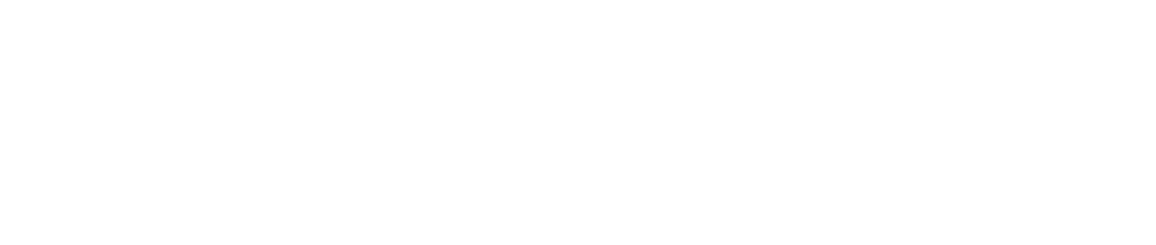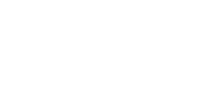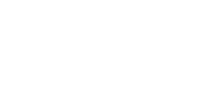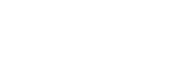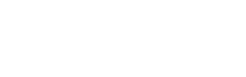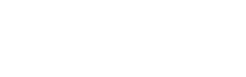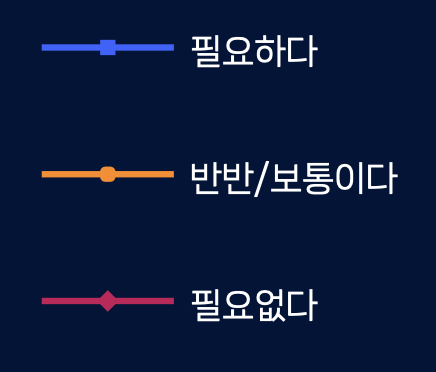칼럼: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초국적 관점에서 다시 보기 – 신혜란 교수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초국적 관점에서 다시 보기
신혜란
2024년 기준 3만4천여명인 탈북민들은 좀처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북한 내부 사정을 알려주는 내부고발자였다. 정치적 집회나 반북 선전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런 정치적 대상화 과정에서 탈북민의 목소리는 자주 왜곡되었다. 탈북민 간의 증언이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 자체에 대한 불신도 깊어졌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은 한국 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였다. TED 무대에 올라 유창한 영어로 북한을 고발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몇 국제단체들은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 (the United Nations) 국제법상으로 탈북민은 난민이다. 국제법상 난민은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본국송환이 금지된다. 남북한이 유엔에 따로 가입했기 때문에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는데 비해,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기 때문에 탈북민은 난민에 속하지 않는다.
탈북민을 정치적 잇속으로만 보는 힘을 빼면 초국적 이주 흐름 속에서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학계에서도 탈북민을 이주민/난민 분야에서 연구하는 추세가 증가했다. 실제로 탈북민의 이동과 정착 경로는 일반적인 난민 및 이주민의 삶의 경로와 유사하다. 주변국가로 이동했고 위험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서 가족과 다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자주 본다는 한 장년 남성은 농촌에서 서울이라는 낯선 곳으로 이주한 자신의 처지가 무엇보다 탈북민과 비슷해서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했다.
심층면담을 해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 직후 대거 북한을 떠난 탈북민들 다수는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한국에 왔다’기보다는 ‘임시 노동이주로 중국에 갔다가 브로커에 의해 중국에 체류하게 되고 다시 다른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와보니 자유가 있었다’에 가깝다. 탈북의 경로는 애초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연결되는 직선이 아니었다.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큰돈 번다는 소문(브로커가 냈을 거라고 짐작한다)을 듣고 몰래 중국에 갔다가 불법체류 중인 탈북민을 쫓는 공안경찰에게 잡힐 두려움에 이른바 인신매매 결혼을 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제결혼은 중국에서 이들을 보호해주는 장치였고 나중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통로였다. 2000년대 들어 여성이 늘어나 전체 탈북민 중 70%가 넘는 까닭이다.
탈북여성의 인신매매는 중국농촌남성 결혼사업 생태계의 작은 부분이다. 사실 한국에서 1980년대 결혼하지 못한 농촌 남성들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브로커에 의한 국제결혼이 성행하게 된 것과 비슷하다. 남아선호와 도시화 과정 이주의 결과 농촌에는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는 결혼적령기 중국남성이 4천만명이 넘을 정도로 많다. 돈이 되는 틈새가 있으니 초국적 브로커 사업이 커져 북한뿐 아니라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중국과 국경을 맞댄 빈곤 국가의 여성들을 중국으로 데려와 결혼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중국에 지참금 (차이리(彩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참금’과 ‘신부를 돈으로 사는 것’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다. 어렵게 데려온 신부가 자주 도망치니 마을 전체가 총각을 위해 신부를 지켜본다. 이렇게 브로커, 중국농촌 남성, 마을의 이해가 맞물려 돌아가는 교착점에 탈북여성의 중국체류가 놓여있다. 나중에 다시 브로커를 통해 태국, 라오스, 베트남, 몽골 등을 경유해 한국으로 향한다.
탈북민 문제는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냉전시대 구조적 권력, 성별선택낙태, 초국적 이주, 결혼이주, 브로커 산업,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빈곤, 우연성, 비공식적 체류, 차별, 정체성, 삶의 전략이 엉켜서 나타나는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차별과 빈곤에 허덕이기도 하고 자영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거나 박사학위를 따기도 한다. 한국에 정착한 이후 다시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제3국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꽤 있다. 이들의 삶은 끝나지 않은 이동과 정착, 경계와 경계를 넘나드는 지속적인 여정이다.
신혜란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통일평화연구원 교육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