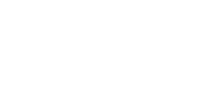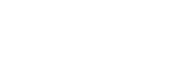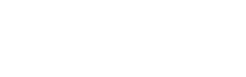통일칼럼: 타이완에서 돌아보는 한국 – 전형준 교수
타이완에서 돌아보는 한국
전형준
서울대 중문과 교수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타이완 칭화대학에서 제5차 동아시아 학자 현대 중국어 문학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 6개 지역의 현대중국문학 전공자들이 모이는 이 학술회의는 일본에서 개최된 1999년의 제1차 회의 이래 싱가포르, 한국, 홍콩을 거쳐 이번에 타이완에서 열린 것인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 참가 예정이었던 중국 쪽 학자 3명이 오지 못한 것이다.
중국 쪽 학자 3명 중 특히 왕푸런(王富仁) 교수가 문제였다. 왕교수는 현재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 하나인 바, 중국 측은 왕교수가 타이완에서 타이완 독립과 관계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 칭화대학 측의 보증을 요구했고 칭화대학 측은 그 요구에 응하지 못했으며 그리하여 출국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게 칭화대학 측의 설명이었다.
이번 회의의 제목이 ‘타이완 문학과 트랜스-문화 유동’이었으므로 중국 측의 그런 우려가 나올 법도 하다고는 하지만, 이 회의의 모든 발표가 다 그 제목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고 왕교수의 발표 제목 또한 ‘중국 문화사에서 루쉰(魯迅)의 지위와 작용’이었으며 그 내용이 타이완 문학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문 바깥의 구두 발언에서 타이완 독립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우려였고 또 칭화대학 측이 중국 측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 이유였다.
타이완 독립은 현재 중국과 타이완 양쪽 모두에서 가장 민감한 정치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은 타이완 독립은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타이완 내부는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는 파(이른바 ‘대독파’)와 중국과의 통일을 주장하는 파(이른바 ‘통일파’) 사이의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다. 제3자이기 때문일까, 필자에게는 ‘독립’과 ‘통일’이 별로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독립’도 가능한 길이고 ‘통일’도 가능한 길이라 생각되었다. 문제는 어떤 ‘독립’이고 어떤 ‘통일’인가 하는 데 있지 않을까, 현재 타이완의 ‘대독파(대만독립파의 약칭)’와 ‘통일파’는 둘 다 부르조아 헤게모니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전제에 대해 별로 의심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심지어는 진정으로 ‘독립’이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완 내부의 권력 획득을 위해 그것들을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것이 필자가 떨쳐버릴 수 없는 의혹이었다.
학술회의에서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듣고 하는 가운데 두서없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필자에게 이런 생각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중국 학자들의 타이완 방문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타이완 학자들의 중국 방문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에 비하면 우리는? 게다가 우리는 독립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못하고(물론 이 말이 독립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로지 통일을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그 전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반성이 없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이것은 필자만의 개인적 문제일는지도 모른다. 아니, 필자만의 개인적 문제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중국 학자들의 불참 사태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비웃는 심정이 되었던 필자는 금세 정반대의 심정으로 추락해버렸다. 타이완의 통독(통일이냐 독립이냐) 문제를 바라보던 필자의 바깥에서의 시선은 타이완에 앞서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할 것인데,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그 시선의 확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타이완에서 돌아보는 한국은, 그래서 더욱 착잡하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 착잡함과 아득함은 이 글을 쓰는 지금 한층 더하다.
전형준 서울대학교 중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