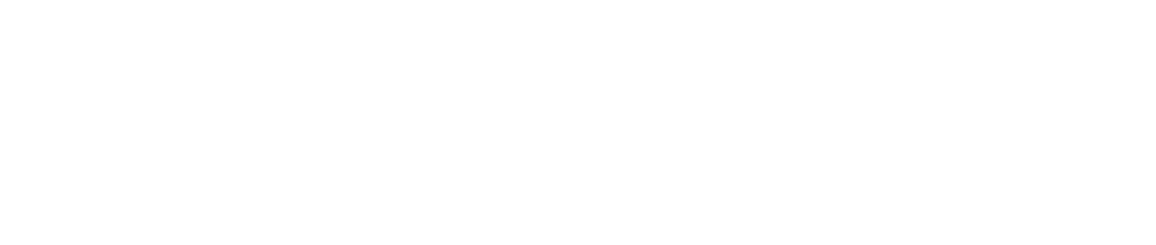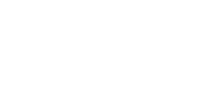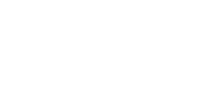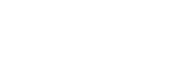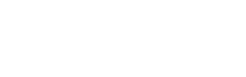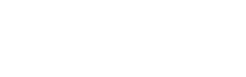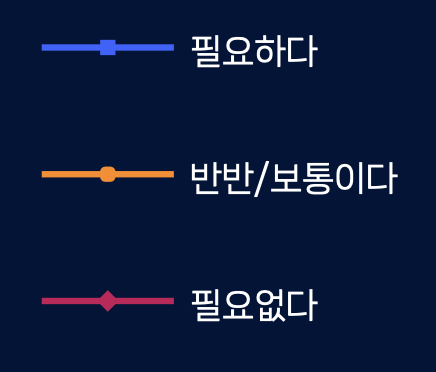[제32차 평화학 포럼] 기후위기 시대, ‘비인간과의 공존’이라는 문제
- 일시: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16:00-18: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발표: 전의령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부교수)
- 좌장: 이승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
- 주제: 기후위기 시대, ‘비인간과의 공존’이라는 문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평화, 그 다양성에 대하여]라는 대주제 하에, 전의령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부교수를 모시고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기후위기 시대, ‘비인간과의 공존’이라는 문제”라는 주제로 제32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승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올렸다.
전의령 부교수는 ‘비인간과의 공존’이라는 화두가 오늘날 널리 이야기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성과 딜레마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기후위기의 또 다른 이름인 ‘인류세’ 담론과, 이를 극복하려는 ‘탈인간중심주의’ 담론이 각각 어떤 한계를 안고 있는지 분석했다.
전 교수는 먼저 ‘인류세(Anthropocene)’ 담론이 ‘망가진 지구에 대한 책임을 인류 전체의 것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담론은 인류를 초역사적, 초계급적인 단일한 존재로 상정함으로써, ‘인간 내부의 차이와 타자성,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역사와 권력이라는 문제를 제거’한다. 실제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은 18세기 영국에서 발달한 ‘화석 자본(fossil capital)’이며, 이는 ‘자본가가 노동을 더 잘 통제해 이윤을 증대하려는 과정’에서 추동된 것이었다. 결국 ‘인류’라는 보편적 이름 뒤에 숨어, 기후위기를 초래한 구체적인 역사와 불평등한 책임 소재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인류세 담론의 모순이라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강연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누적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당 부분은 미국(24%) 등 소수의 부유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전 세계 최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52%를 차지하는 등 책임의 불평등은 명확하다.
다음으로 전 교수는 ‘탈인간중심주의’의 딜레마를 제시했다. 이 사상은 비인간을 인간과 함께 세상을 ‘공동생산(co-produce)’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보며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통찰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담론이 ‘인간-비인간 얽힘’에 집중할 때, 정작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인간 사회 내부의 불평등, 착취, 모순과 같은 균열을 식별하기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인간과의 공존’이라는 구호 역시 북극곰 같은 ‘좋은 비인간’과 모기 같은 ‘나쁜 비인간’을 구분하며, 이미 인간의 필요에 따라 비인간을 선별하고 위계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전 교수는 인류세와 탈인간중심주의 담론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비판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의 말을 인용해 “생태학적 위기의 열쇠는 생태학 그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협약 탈퇴와 재가입, 그리고 재탈퇴 가능성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위기 대응이 인류 전체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특정 국가와 정치 체제의 책임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진정한 해결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그 자체를 구성하는 인간 사회 내부의 불평등하고 착취적인 정치·경제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